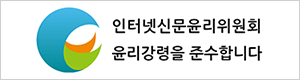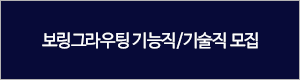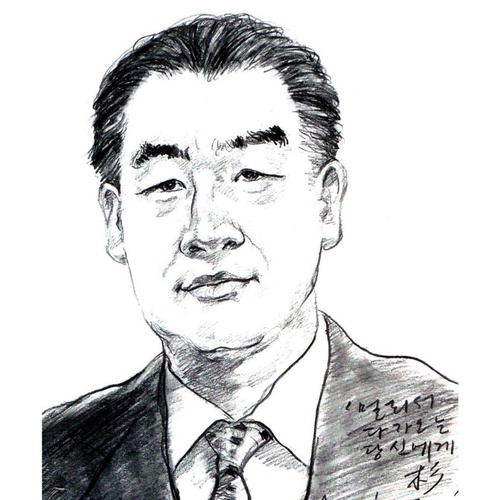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
나는 입이 없습니다 귀만 있어 크게 듣기만 합니다. 남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설화(舌禍)는 없지만 때론 설화(雪花)의 물결소리가 귓전을 스칩니다.
- 이현원
[쪽 수필] 신심단체의 정기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 조를 이루어 앉았다. 어느 본당에서 온 누구라고 인사를 나눈 다음 침묵하라 했다. 함께 강의를 듣고 장소를 옮겨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놀랍도록 진솔하게 친근감이 생겼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 소통하고 나누던 것들의 가치는 무엇일까. 온 몸이 입이고 귀가 된 셈이다. 표정과 태도 만으로도 친밀감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신기했다.
그 때 이후 필요에 따라 입을 닫고 귀를 여는 훈련을 해보았다. 하지만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 끼면 내 입은 자연 개화되는 꽃송이 같아진다. 이 또한 건강 신호로 이해하고 인정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 시기를 거쳤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적응하며 각자도생, 홀로서기, 유구무언을 생활화 하면서 확실히 내적으로 성장했다. 그러고보니 완전히 나쁘거나 좋은 때는 없는 것 같다.
모든 공적인 일을 놓은 요즈음, 디카시 창작에 몰입하며 비대면 문화에 적응했다. 입 대신 눈과 손과 발이 바쁘다.
입이 있으되 없는 것같이 살라는 말이 먹히는 날이 온다는 게 신기하다.
* 오정순 수필가 / 시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