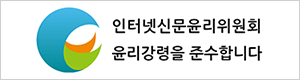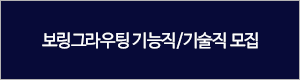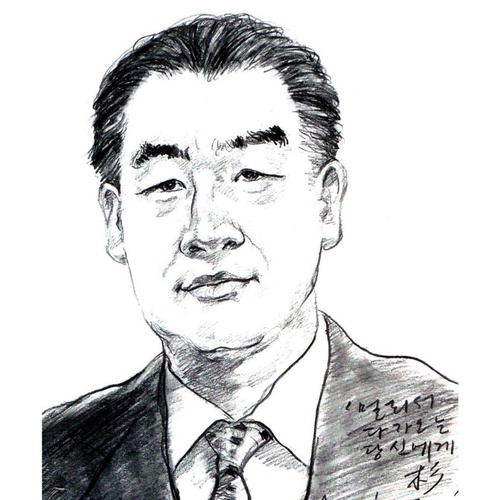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시사앤피플] 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 대학원에서는 이번 봄학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 바이오투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바이오투자는 한 때 붐을 이루었다가 지금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도 투자받고자 하는 사람도 새 길을 찾고 있다. 해결책이 더 절실한 것은 바이오 창업자들이다. 투자자들은 바이오가 시원치 않으면 다른 분야로 옮겨갈 수 있지만 창업자들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포럼에 참여하는 연자와 토론자들의 견해가 크게보면 둘로 갈리고 있다. 하나는 한국의 바이오투자가 얼어붙었고, 생태계가 잘못되어 있어 바이오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힘드니 아예 미국으로 가야된다는 견해다.
다른 견해는 한국에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많고 초기투자 받기가 쉬우니 한국에서 해볼만하다는것이다. 바이오투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다.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잡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이를테면 넓게 잡아 식품,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신약연구개발, 의약품생산,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한정해서 본다.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의약품 생산을 제외하면 역사가 짧다. 전세계적으로도 생명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텍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바이오산업은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위험부담이 크다. 한국 기업들이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앞길이 녹록지 않다. 지난 2주간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만 일대(Bay Area)를 방문하였다. 둘다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보스턴에서는 동물헬스케어 분야의 기업들이 모이는 큰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했고, 바이오분야에서 일하는 지인들도 만났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카이스트 바이오혁신경영 MBA과정 학생들과 함께 바이오텍 기업, 의료기기 및 진단 기업, 그리고 바이오 액셀러레이터 등을 둘러보았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동물헬스케어 중에서도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반려동물 헬스케어다. 소, 닭, 돼지 등 가축에 대해서는 집단방역 개념은 있지만 개체에 대한 치료라는 개념은 없다.
이에 반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의 건강을 보호자들이 챙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개 사람에 쓰는 약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약에 대한 효과가 동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신약개발은 바이오 후발주자인 한국으로서는 해볼 만한 분야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반려동물 신약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 크게 도움될 것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좋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미비한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보스턴에서 만난 바이오분야의 한국계 A교수는 최근 한국의 대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연구병원들이 공동연구를 하자고 몰려와서 고민이라고 했다.
그 배경은 한국의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보스턴 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만 바이오분야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A교수는 한국측에서 제안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들여다보면, 연구인력 등 연구인프라를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제대로 설계된 게 아니라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 공동연구 제안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필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해서, 한참 생각 끝에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연구개발예산 책정과 관리가 잘못된 점이 많다. 그래도 공동연구에 응하여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가면서 돕는 게 좋겠다.
한국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성취한다. 지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는 제넨텍 같은 초기 바이오텍 기업이 소재하고 있어 바이오텍 산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탠포드, 버클리, UC샌프란시스코 등 그 일대의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이나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바이오텍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도 만나고, 창업하여 촉망받는 기업을 일구고 있는 젊은이들도 만났다.
바이오텍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많았다. 투자자들이 창업을 권하고 창업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바이오창업하려면 미국으로가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한국 바이오투자의 새 길을 찾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 경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바이오강국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 채수찬 경제학자 • 카이스트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