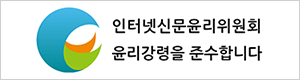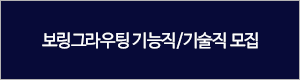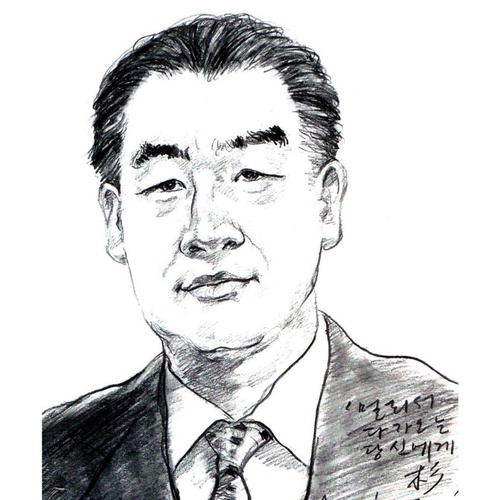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
모래시계 - 시인 이둘임-
누군가의 시간이 유리병 속에 갇혀 있다
비워낼 힘만 남은 어머니 병실 옆 침대에 콧줄 끼고 계신 분 시간을 다 써 버렸는지 세상을 버렸단다
모래 알갱이들끼리 서로 싸우며 부딪히는 동안 눈깜짝할새가 모래를 훔쳐 날아갔을지도 모르는 일
안타까운 시선이 머무는 곳 정해진 시간이 유리병 속에서 흐른다
시간의 주인이 되겠다는 모래 알갱이들 꽃을 피우지 못한 사막을 떠나 한 줌의 시간으로 꽃이 되겠다고
[작품 해설] = 강기옥 문화전문 기자 = 1995년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리에 방송된 후 모래시계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했다. 영어의 sand timer가 말해주듯 ‘모래시계’는 시계라기보다는 ‘타이머’로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도구다.
그런데 드라마의 영향인 듯 시계라는 용어로 일반화되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리 잘록한 모래시계가 이제는 달걀이나 행주를 삶고 라면을 끓이는 주방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새 천년을 맞아 정동진에 세운 모래시계가 소품의 상품화에도 기여한 탓이다. 이둘임 시인은 그 사소한 일상의 도구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시로 승화시켰다.
모래시계가 지닌 한정성과 유한성을 극복하여 꿈을 이루려는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을 주제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그 이웃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유리병 속의 ‘모래 알갱이들’처럼 안타깝게 이어지는 순환의 연속성이라는 데 있다. ‘시간의 주인이 되겠다는/모래 알갱이들’이 ‘꽃을 피우지 못한 사막을 떠나/한 줌의 시간으로 꽃이 되겠다고’ 하는 다짐은 뒤집어야 다시 쏟아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구나 ‘-되겠다’고 완결형으로 맺지 않고 미완형 문장의 ‘-되겠다고’라는 자기 다짐으로 맺은 것은 독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법이다.
즉 느슨하게 여운을 두어 시심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1연과 4연에서 두 번이나 제시한 ‘유리병 속’으로는 독자를 가두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재미있는 것은 ‘눈깜짝할새’와 같은 새로운 시어의 발굴이다.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눈깜짝할새’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았다. 누구나 인생이 ‘눈깜짝할새’와 같이 빠르다고 하지만 심정적인 느낌일 뿐 시간은 변함이 없다.
‘이둘임’이라는 이름의 중의적 의미처럼 ‘눈 깜짝할 새’는 세상에서 가장 바른 새로 둔갑했다. 2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선언, 그것이 ‘이둘임’이다. 물론 둘은 ‘두斗’의 ‘두’자에 ‘을乙’의 ‘ㄹ’을 합성한 한국식 한자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시에는 대나무 마디를 삶의 마디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중의적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병실을 지킨 누군가의 삶을 통해 유리병 속에 갇힌 시간을 ‘싸우며 부딪히는’데 사용하지 말고 ‘꽃을 피우지 못한 사막을 떠나’는 각오로 꿈을 피워보리라는 깨달음, 독자를 향해 제시하는 주제가 철학적이라서 감상의 맛이 있다. ‘눈깜짝할새가’가 모래 한 줌을 훔쳐 달아난 것처럼 인생도 허무하다는 깨달음과 함께...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옥 문화전문 기자
kangkk52@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