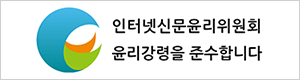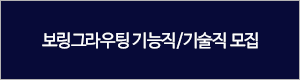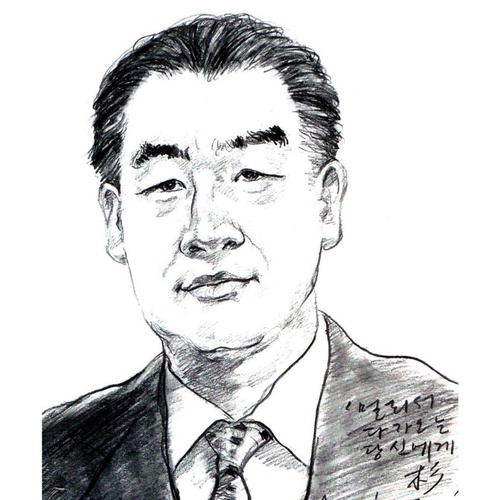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
‘앗, 청개구리다!’ 아침에 일어나서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난데없이 수도꼭지에 연두색의 손톱만 한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 어찌나 놀랐던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벼 보았다.
김장을 며칠 앞둔 12월 초순에 어떻게 청개구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초벌 김장을 한다고 배추 두 포기를 사 온 일밖에는 없었다. 나는 청개구리를 살려야겠다 싶어서 대나무 소쿠리에 뚜껑을 덮고 배춧잎을 넣어주었다. 청개구리는 고맙다는 듯 발딱거리는 가슴으로 눈을 껌벅거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개구리는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개구리 집을 욕실로 옮겼다. 우리 집에서 겨울을 잘 나고 봄이 되면 풀밭으로 보내줘야 할 텐데…. 추운 겨울날 쪼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식구가 되었다. 개구리는 살아 있는 곤충만 먹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먹이를 구해올까 걱정거리가 생겼다. 소쿠리 속에 이놈을 가둬놓으면 답답할까 싶어 뛰어다닐 수 있게 뚜껑을 열어주었다.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흔적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욕실 거울에 찰싹 붙어서 눈을 껌벅이며 바라보았다. 하찮은 미물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물이 있는 욕실로 찾아갔나 싶어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 주었다. 어떤 때는 욕실 수도꼭지에 올라앉아 있었다. 우리 집 수도꼭지는 백색이라서 청개구리와 배색이 잘 어울린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에게 “당신은 참 좋으시겠소.”라고 했더니 뭐가 좋으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오면 예쁜 것이 둘이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하니까 “아 청개구리 말이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뭐지?”라고 물었다. 개구리와 예쁜 아내 중 누가 더 예쁘냐고 물었더니 개구리가 예쁘다고 능청을 떨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눈을 흘겨주었다. 남편이 나보다 개구리와 더 친한 것 같아서 괜히 심통을 부렸었다.
아이들이 자라서 집을 떠나고 부부만 살아온 지 십여 년째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이나 신문을 읽지만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그러던 참에 느닷없이 찾아온 청개구리는 우리 집의 귀염둥이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 삭막하고 추운 겨울날 청개구리와의 동거는 참 신선했다. 녹색의 점 하나로 생긴 놈이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 귀엽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는 모두 고귀하다. 요놈이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보는지 대부분 거울에 붙어서 산다.
거울에 내 얼굴을 바짝 대고 “거울아, 거울아 청개구리하고 나하고 누가 더 예쁘니?”하고 물었더니 요놈의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내 가슴팍으로 달려들었다. 자기가 더 예쁘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는 듯이. 어떤 때는 어디로 나들이를 갔는지 한 이틀쯤 안 보일 때도 있었다. 혹시라도 죽을까 봐 나는 개구리를 찾느라고 이 구석 저 구석을 살폈다. 내일은 나오겠지 하면서 청개구리가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어서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 모니터 앞에, 또는 잎이 넓은 행운목 위에 앉아 있다. 엄지손톱만 한 청개구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옷 색깔이 비슷한 행운목 이파리에 앉아 있으면 더욱 어렵다. 남편은 이러다가는 습기가 없어 그놈이 말라 죽게 된다면서 욕실에 가두고 욕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나니 이게 웬일인가. 안방 화장대 거울 앞에 붙어서 나를 빤히 바라보는 게 아닌가. 아니! 요 녀석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내 이브자리에서 동침을 하였는가? 몸이 움찔했다. 강아지를 안고 잔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개구리와 잠을 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 징그럽기도 하지만 깔려죽기라도 하면 어쩔 것인가.
며칠 동안 그놈을 못 나가게 욕실 문을 닫아놓았더니 욕실 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이놈을 찾아서 옮겨 놓고 청소를 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디로 숨었는지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욕실 거울 뒤에서 박제된 청개구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쉬이 이별이 올 줄은 미처 몰랐다. 폴짝폴짝 뛰어서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다. 봄이 되면 푸른 풀밭으로 꼭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인연이 너무 짧았다. 남편은 너무나 애석해하는 나에게 청개구리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리고 불쌍한 청개구리 시신을 아파트 화단에 묻어주었다.
해가 바뀐 여름은 무더위도 일찍 찾아왔고 예년에 비해 장마도 길었다. 잠시 비가 개어 외출을 하려고 나섰는데 화단에서 오늘도 청개구리가 울고 있다. 북풍한설 몰아치던 그해 두어 달 동안 청개구리와 함께 살았던 푸른 기억들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 이금영 수필가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