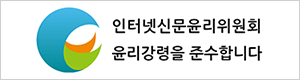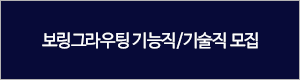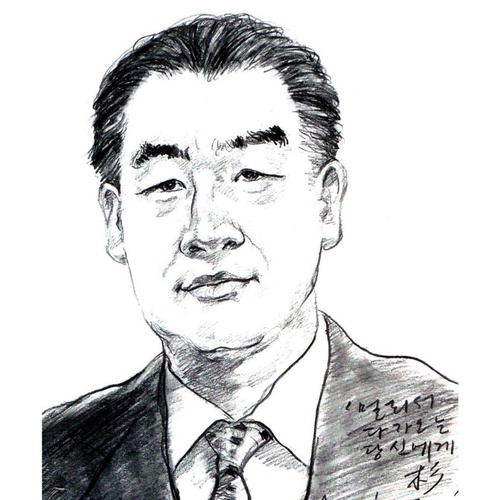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행복'과 '삶의 질'과 같은 용어들이 정부 정책과 국회 법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가 주도의 탑다운 정책에서 점차 민생을 세심하게 돌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려는 관점의 변화와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행복과 삶의 질이 정책과 입법에서 레토릭, 수사, 즉 말로만 끝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마치 측정하기 곤란한 추상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해당 ‘정책과 입법이 언젠가는 국민 행복에 닿을 거야’, ‘어떻게든 기여하겠지’라는 식으로 언급된다는 점이다.
행복과 삶의 질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정책과 입법 활동의 관점에서 두 가지 한계점이 있다. 하나는 이러한 언급이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레토릭에 국한된 '행복'과 '삶의 질'은 없어도 되는, 너무 당연해서 효용이 없는 말이 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얼마만큼 향상시킬지,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실제 정책과 법안은 그로 인해 행복과 삶의 질에 도움을 받는 국민도 있지만, 의도와는 달리 특정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입법은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 인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다시 효과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는데 활용하는 되먹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행복과 삶의 질 개념과 측정, 평가를 본격적으로 정책과 입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행복과 삶의 질의 개념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추상적이지 않다. 학문적으로도 탄탄한 이론과 측정 방법이 정립돼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매년 몇천 건씩 쏟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행복과 삶의 질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책과 입법의 현장으로 들여오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공공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때 정책이 웰빙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과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부처별 칸막이 예산을 깨고 정부 부처 전체의 협력을 통해 행복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웰빙을 증진하는 데 예산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복과 삶의 질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부터 OECD의 Better Life Index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모색하고, 취약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를 한 바 있다. 그 이후도 사회지표 관리 강화 추진 및 포용국가사회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자료에서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낮은 '국민 행복지수'를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단위로 내려갈수록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나 모니터링, 평가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행복과 삶의 질은 정부의 국정과제나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자료에서 처음 나오는 '배경' 부분에서 언급되다가 본론에서는 연계성 없이 원래 정부나 부처가 하려 했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제는 행복과 삶의 질을 추상적인 관념 차원에서 현실의 차원으로 가져와서 실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시기다.(출처 :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생각 1월 17일자)
*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