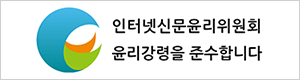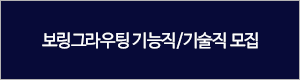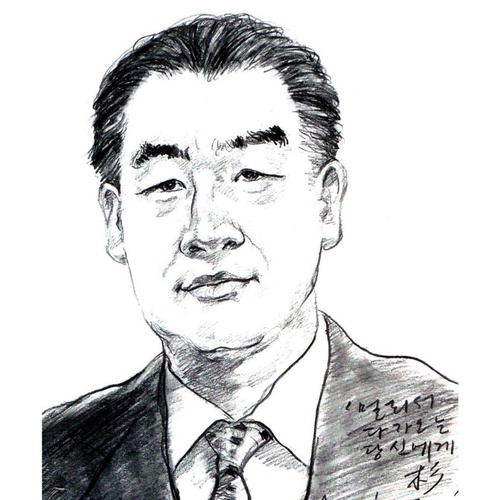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시사앤피플]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장충체육관 1층엔 노인들로 가득 찼다. 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됐다.
아버지는 1919년생으로 살아 계신다면 지금 105세이시다. 1983년 9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 70세의 일기로 1988년 6월 7일(양력 7월 20일) 영면하셨다.
아버지는 83년 어느 날 쓰러진 이후 몇 달 간 필담이 가능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돼 나중엔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게 됐다. 중증 환자가 된 아버지를 요양하시던 어머니는 가장 힘든 일이 용변처리라 했다.
연약한 어머니는 무거운 아버지 몸을 일으키고 눕히시는 게 무척 힘이 들었다. 그 때만 해도 요양 보호사가 없던 시절이라 숙명으로 알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일을 수년동안 해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가끔씩 아버지를 뵈러 가면 어머니는 통역관이 됐다. 아버지께서 불확실한 발언을 연속하시면 어머니는 그 분 곁에서 내게 통역을 해 주시곤 했다. 아버지는 말씀을 못했지만 듣는 것은 분명해 손으로 또는 고개로 가부를 명확히 표현해 냈다.
이에 앞서 발병 당시 아버지는 나에 관한 충격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몇 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됐다.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다. 지금도 그 얘기를 되새기면 마음이 아프다. 아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충격을 준 말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의 그 짧은 몇 마디는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야야, 네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무슨 말을 한 지 아느냐”고 했다. 나는 “모르는데요”라며 응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야 그 말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쓰러짐을 ‘아들’에 알리지 말라”였다. 이 말씀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과 거의 닮거나 같은 심정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 문장 구조에서 아들과 조국이란 목표만 다를 뿐이지 문장의 형태나 화자의 마음씨는 똑 같다.
그 때 당시(83년) 나는 취업준비로 한창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다. 어머니에 의하면 “아버지는 내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발병으로 충격을 받을까 봐 내게 발병 사실을 모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신 말은 “네 아비가 너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 지 아느냐. 완쾌되면 아버지한테 더 잘 해 줘라”였다. 나는 어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고 정성을 들였는 지를 가슴으로 알고 있다. 어머니의 말씀에 즉각 “얼른 취업을 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나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됐던 지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도 어머니는 내가 효도하겠다는 그 말에 울꺽 할 정도의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지난 8일 어버이날 장충체육관에 갔을 때 40년 전 아버지와 얽힌 스토리 하나가 떠 올라 내 마음을 눈물로 젖시게 했다. 주위에 참석자들이 많아 나는 속울음으로 울고 또 울었다. 그러면서 엊그제 아들 내외와 손녀 손자가 어버이날이라며 정성들인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를 순간 떠올렸다.
나는 현장에서 마음 속으로 아들들과 대화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는 지 아느냐. 말은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나 있냐”하면서... 한 참을 서 있었다. 나는 가부장적인 집에서 성장해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아 자식들이 성장기에 좀 엄격하게 대했던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들들에게 ‘사랑한다‘는 이 간단한 말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지냈다. 그 말이 입버릇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을 가벼운 처신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사실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놈들을 위해 주고 사랑하지만 그 간단한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는 근엄하시고 아들들에게 더 엄숙하셨다. 그리고 아들은 더 강하고 남성다워야 한다는 식이다. 또한 남자는 부엌에 가지 마라. 가볍게 입을 돌리지 마라,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모 앞에서 지 새끼 예뻐하지 마라, 어데가서 마누라아 자식 자랑 마라 등 지금 생각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랬던 지 나는 아버지를 닮으며 성장해서 그런 지 다른 사람들에겐 잘 대해 주면서도 아들들에겐 자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도 그 뒷면엔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 둘씩 안고 다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나에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점도 다수 있는 것 같다. 아들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는 순간이다.
“나의 쓰러짐을 ‘아들’에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의 이 말씀은 자식과 가족을 위해 또한 아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 마음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응축해 낸 표현이다. 이순신 충무공이 병사와 조국을 위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 남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의미 심장한 내용을 담은 표현이라 나는 믿는다.
* 이민영 시인(본사 편집국장)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디.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