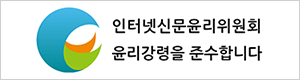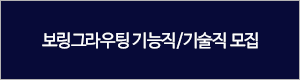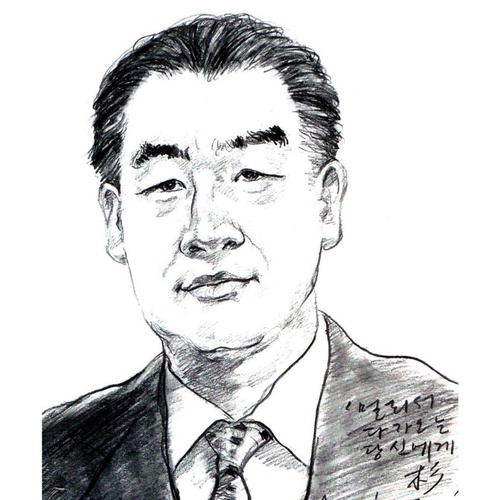똑같은 음식점 한 집만 바글바글 줄 서서 먹어봤지만
발끝도 못 따라온다 한 양푼 뚝딱인 엄마 손맛 - 작가 위점숙
[쪽 수필] 가평에 가면 새벽 해장국밥집이 나란히 있다. 한 집은 기울어져 가는 시골집 그대로이고 다른 한 집은 개축을 하여 말끔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한다.
깔끔한 식당이 문을 열면 도시의 손님들이 자기네 식당으로 몰려들 줄 알았다고 한다. 아니었다. 기어들고 나는 그 할매 식당은 앉을 자리가 없는데 새 식당에는 파리가 날린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묻고 또 물었다 사람 속은 매 한 가지, 내가 다니는 위생적인 식당 주인이 앓아 누웠다.
도시인들의 대부분은 시골에 고향을 두고 살다가 엄마 같고 이모 같고 고모 같은 허리 구부정한 할매네가 편한 걸까. 필경 국물 맛 만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지는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매의 눈이 되어 그 집의 사람 불러들이는 이유를 찾았다. 손님이 식당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할매가 따라 나선다.
“맛있게 먹었으니 공 잘 치고 가셔.”
차 꽁무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배웅한다. 그러고 보니 새 집 안 주인은 밑반찬 가지 수 늘리기에 예쁜그릇 챙기기까지 신경을 쓰는데 사람에게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였다.
할매네 국밥은 식당에서 먹어도 엄마 밥인데 새 식당 국밥은 반찬이 걸고 많아도 식당 밥이지 엄마 밥이 아닌 거였다.
* 오정순 수필가/시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