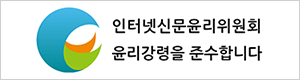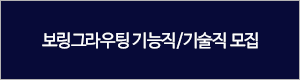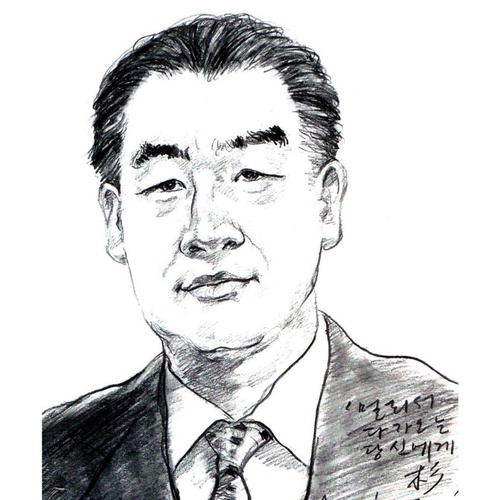겨우 오른 한 평 땅이 밑심 단단한 할머니의 영토
바람과 햇살이 옴폭하니 잎잎에 산천이 일렁인다
작가 - 신미경
[쪽 수필] 나는 안다. 옹색한 축복, 그 한 평의 힘을. 결혼하여 첫 등기부등본을 가진 것은 열다섯평 아파트였다. 경험 밖이라 닭장 같다고 상을 찌푸리다가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고 환해서 단박에 정이 들었다. 그 집에서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 살아도 좋겠다며 만족해 했다.
한참 뛰노는 아이들을 키우던 80년대 초에 이미 부동산 광풍이 불어 자고나면 집값이 뛰었다. 동네가 이삿짐 오가느라고 어수선해졌다. 결국 이웃하고 살던 동생과 나도 이사 가기로 했다. 갓집인 나는 가장 늦게 팔리면서 겨우 한 평 넓혀 대단지 16평으로 옮겨 앉았다.
궁둥이를 움직일 수 없는 한 평의 공간이 얼마나 요긴한지 저 할머니와 둘이 말 배틀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에게는 산천이 일렁이고 나에게는 베토벤 모차르트가 놀고 가는 자리가 되었다.
피아노와 서랍장 자리가 생겼다. 할머니는 한 평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요 나는 아이들 꿈을 가꾸는 한 평 정원사가 되었다. 돌아보니 한 평에 딸 아이를 앉히고 내 꿈을 이식하려 든 정원사는 꿈 접목에 실패했다.
아파트 바람, 정명훈 바람이 불어가고 다시 우리 식구는 바람의 가족이 되어 고층 아파트에 정착하여 할머니처럼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한 평의 베란다 정원을 가꾸었다.
ㅡ자식을 향하던 대리 욕구는 뿌리내리지 못했어도 한 평의 흙에서는 어김없이 꽃을 피워냈다.
* 오정순 수필가 / 시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