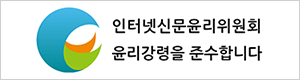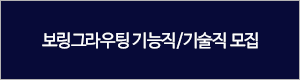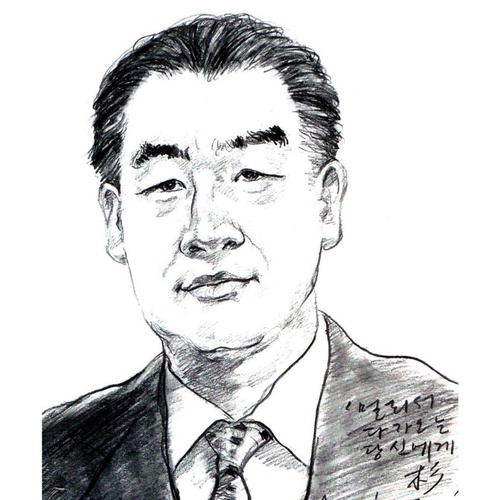|
[시사앤피플] 춘추전국시대를 지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룬 왕조는 대부분 태조를 이어 태종(太宗)이 나타난다. 태조는 전 왕조가 혼란한 틈을 타 새로 나라를 세운 국조(國祖)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나 태종은 선택사항이다.
15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진나라는 시황제라는 서수(序數)의 명칭을 사용하여 2세 황제로 끝났고, 38년을 지킨 수나라는 수문제, 수양제로 끝나 시조 양견(楊堅)을 고조(高祖)라 한다.
중국은 국조를 고조(高祖), 또는 태조(太祖)라 한다. 한나라의 국조 유방은 시호가 고황제(高皇帝)라서 한고조, 송나라의 국조 조광윤은 태조라 한다. 고조나 태조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나 성격상 건국 과정에서 피를 많이 보았기에 태조를 무제(武帝), 대를 이어 평화를 이룬 왕을 문제(文帝)라 한다.
태종(太宗)은 태조가 어렵게 세운 나라를 수습하고 분란을 평정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진 임금에게 내리는 묘호(廟號)다. 실질적으로는 태조를 도와 건국에 큰 공을 세운 2세들 중에 태종이 나타난다. 당 태종 이세민, 송 태종 조광의, 원 태종 오고타이, 명 태종 주체 등이 출중한 인물로 꼽히며 조선에서도 태종 이방원이 있다.
태조와 태종대의 치세는 개국과 평정이라는 상반된 질서가 필요하여 새로운 기틀을 다지려는 통치자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 단계에서 국체의 틀을 다지지 못 하면 곧 패망의 길로 접어들거나 난신에 의해 왕권이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치(德治)와 법치(法治)를 적절히 조화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이용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태종 이세민과 24장(將)의 이야기다.
626년에 태조 이연의 차남 이세민은 태자이자 형인 이건성과 아우 이원길을 죽이는 ‘현무문의 변’을 일으키고 황제에 올랐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과 비슷한 경우다. 태종은 대부분 태조의 친자로서 개국에 공을 세우고 권좌에 오르기 위해 뜻을 달리하는 반대파는 물론 형제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했다.
창업보다 수성(守城)이 어렵다는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래서 당태종은 ‘정관의 치’라는 칭송을 받으며 당나라를 강국으로 이끌었기에 태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렸다. 정확히 문무대성대광효황제(文武大聖大廣孝皇帝-줄여서 文皇帝)라 한다. 문황제(文皇帝)지만 무도 겸했기에 문무대성이라 했다.
문황제다운 면모는 632년에 390명의 사형수를 사면한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형 집행장에 사형수를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을 고향으로 보내줄 테니 고향에서 부모 친지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내년 가을 이 시각에 다시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면이라는 것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사자, 소인지행 군자지소불행(赦者, 小人之幸, 君子之所不幸)’의 이 명언은 조선왕조에서도 임금의 무분별한 사면에 대해 견제를 가하는 인용구로 사용했다.
당태종 이세민이 무제(武帝)로서의 용맹만 갖추었으면 문제(文帝)다운 지혜는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사형수의 사면을 큰 시험과 같은 도전에 비유하여 ‘소인의 행(幸)과 군자의 불행(不幸)’으로 표현하여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중국 역사상 위대한 황제로 추앙받고 ‘정관의 치’로 칭송받는 것은 그런 덕치에서 기인한다.
참고로 고려에 태종이 없는 까닭은 왕건이 평화롭게 통일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29호족의 딸과 혼인을 맺어 인척을 이루었으니 대를 이은 혜종은 치열한 권력투쟁에 유혈사태를 빚을 이유가 없었다. 그에 비해 이방원은 조선 개국을 위해 피를 많이 보았고 형제간에 유혈사태를 빚었다. 그래서 잔인하고 몰인정한 느낌을 주는 태종이지만 잦은 사면으로 민심을 달랬다.
조선 태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사가 있다. 1403년(태종 3년) 5월 5일에 경상도의 조운선 34척이 바다에 침몰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나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를 붙잡아 그 까닭을 물으니 ‘이 고생스러운 일에서 떠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책임은 내게 있다. 만인(萬人)을 몰아서 사지(死地)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닷샛날은 음양에 수사일(受死日)이고, 또 바람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행선(行船)할 날이 아닌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나가게 한 것이다.’라며 탄식했다.
더불어 쌀 만여 석과 사람 천여 명의 손실을 보고받은 태종은 ‘쌀은 비록 많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마는,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조운(漕運)하는 고통이 이와 같으니, 선군(船軍)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해 흩어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며 육로로 운송하기를 권했다. 이세민의 사면과는 차이가 있으나 군주로서의 애민사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1401년(태종 1년) 12월 5일에 태종이 사면하려 하자 대사헌 이지가 ‘赦者, 小人之幸, 君子之所不幸’을 들어 불필요한 사면에 제동을 걸었다. 사면의 올바른 선택을 제시한 것이다. 세종 이후의 사면 기사는 임금과 신하가 당태종의 명구를 같이 인용한다. 왕조시대에도 무분별한 사면은 백성과 신하의 지탄이 되었던 것이다.
현대 정치에도 사면은 통치자의 권한이라 왈가왈부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치 성향이 보이는 사면은 소시민들이 공분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소인과 군자 모두가 두 손 들어 환영하는 통치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세민이나 이방원과 같은 성군을 기다려 보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혼란한 시기의 역사에서 한 수 배우는 것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지혜다.
* 강기옥 문화전문 기자(시인)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옥 문화전문 기자
kangkk52@daum.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